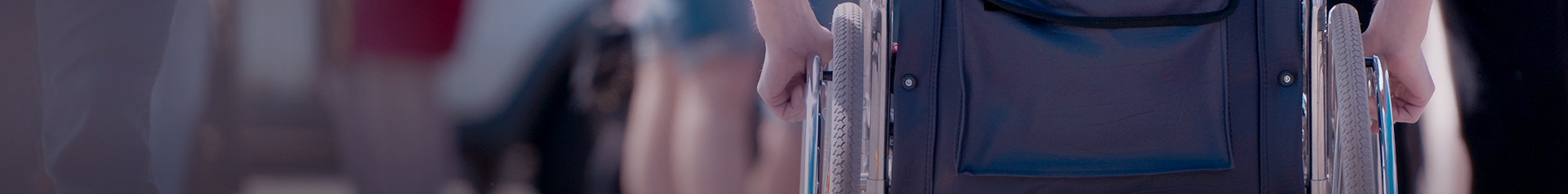
장애인 만성질환 관리
| [저널클럽] 지역사회에서의 중증 장애 위험요인-노인을 중심으로(04.25.) | ||
|---|---|---|
| 작성자 박민지 | 조회수 449 | 작성일 2022.04.25 |
|
지역사회에서의 중증 장애 위험요인-노인을 중심으로- 정서연
중증장애가 발병하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질병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며, 환자와 보호자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다수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중증장애의 유형은 두가지로 분류되는데 경증장애의 단계를 통해 점진적으로 증상이 악화된 진행성 중증장애와 급성 중증장애로 구별하였다. 특히 기존연구에서는 중증장애 유형에 대한 구분과 더불어 잠재적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급성기 중증장애의 경우 중재질병(intervening illness)이나 부상에 의해 발병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1) 장애는 일시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2) 장애에 대한 평가 간격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 발병의 잠재적인 요인이나 functional transition(기능적 상태, 부상과 같은 외부 요인)사이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우며, 3) 입원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증과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갑작스럽게 촉진되거나 악화될 수 있다는 연구들로 인해 한계가 있었다. 잠재적 위험요소로는 응급실방문, 활동성 제한, 입원, 장애평가 간격 등이 있는데, 본 연구는 중증장애와 관련된 잠재적인 위험요소와 촉진?유발?요인을 평가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증증 장애의 발병을 예방하고, 장기요양의 필요성과 진료비 증가를 줄이기 위한 제언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자는 일상생활에 장애가 없는 70세 이상의 노인이 분석 대상자로서, 대부분 large health plan의 구성원이며, 심각한 인지장애, 이사 계획중인 사람, 영어할 수 없는 사람 등 제외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월별 전화인터뷰 및 메디케어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수집되었다. 참여자의 위험요소는 1.건강관련요인(만성질환, 시력, 청력, 노쇠 등 9가지) 2. 인지-심리사회적요인(인지상태, 우울증상, 기능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원), 3. 행동요인(흡연, 체질량지수), 4. 신체적능력요인(Short Physical Performance Battery): 노인의 하지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도구(기립 균형의 계층적인 평가, 보행속도테스트,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5회 서기), 5. 기타 신체적 요인(우세적이지 않은 팔다리, 상지(上肢)와 하지(下肢) 근력, manual dexterity(조작능력), 신체운동능력(몸통, 다리, 팔의 큰 근육을 포함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호흡 측정)이였다. 잠재적인 유발요인은 1) 입원, 2) 응급실 방문o, 입원x, 3) 신체활동 제한 입원x, 응급실방문x으로 구분하였다. 장애평가는 목욕, 옷 입기, 걷기, 이동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로 한지에 대한 조사결과로 보았으며, 장애 심각정도: 경증과 중증 활동 횟수로 측정하였다. 인지장애는 대리인을 통해 인터뷰 수행하였다. 통계분석은 18개월 간격으로 관찰을 수행. 잠재적 유발요인과 중증장애 발병사이의 연관성을 평가하였다. 대상자의 위험인자 특성을 중증장애 유형(진행성, 급성, 둘다)에 따라 분류하였다. 3550명의 연구대상자 중 469명(13.2%)에서 중증장애가 발생하였다. 급성장애(9.7%)의 발병률은 진행성 장애(3.5%)보다 상당히 높은편이였지만, 진행성 장애로 발전하는 평균(SD) 시간은 급성장애보다 약간 더 길었다. 각 결과에 대해 장 강한 연관성은 노쇠에서 관찰되었다. 노쇠는 중증장애가 없는 그룹에 비하여 진행성 장애가 6.2배 높았고, 급성장애의 경우 3.1배 높았다. 또한, 낮은 자기효능감은 중증장애가 없는 그룹에 비하여 진행성장애의 경우 4.6배 높았고, 급성장애의 경우 2.8배 높ᄋᆞᆻ다. 또한, 신체적능력요인(SPPB)의 경우 진행성 장애의 경우 5.5배, 급성장애의 경우 3.7배 높았다. 근육저하의 경우 진행성장애에서 높은 연관성을 보였는데, 상체의 경우 3.4배 높았으며, 하체는 3.1배가 높았고 손과 같은 조작능력의 경우 3.2배 높았다. 장애 유형에 따른 잠재적 유발요인에 대한 연관성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입원 노출율의 경우에는 중증장애가 없는 그룹의 경우 2.2, 진행성 중증장애 그룹의 경우 10.6, 급성 중증 장애는 10.8이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입원은 중증 장애가 없는 그룹에 비해 진행성 장애에서 62.9배 입원하는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급성의 경우에는 375.3배 높았다. 응급실 방문은 진행성 장애는 12.4배 높았고, 급성장애는 38.3배 높았다. 추가로 입원의 사유는 심장, 감염으로 인해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고, 응급실 방문의 경우에는 근골격계, 심장 및 낙상 또는 이동문제가 높았으며, 활동 제한의 이유로는 무기력이 가장 높았다, 위험요인에서는 85세이상, 청력손상, 노쇠, 인지장애, 낮은 자기효능감, LOW PEAK FLOW 등이 진행성 장애와 연관성이 높았으며, 급성장애는 시각손상, 청각장애, SPPB, LOW PEAK FLOW에서 연관성이 있었다. 두가지 유형의 중증장애 모두 RISK FACTOR에 보다 입원, 응급실 방문 등의 요인에서 연관성이 더 뚜렷하였다. 마지막으로 입원을 제거하였을 때 진행성의 위험이 3배 낮았고, 급성 중증장애 위험이 12.3% 감소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노인들의 중증 장애의 발병을 예방하고 그에 따른 장기요양을 줄이기 위해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중증장애의 경우 제 기능을 회볼할 가능성이 경증장애에 비해 상당히 낮고, 중증장애는 비용이 많이 들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노인 사망에서 대부분은 중증장애가 선행된다는 점을 미루어보았을 때 장애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입원, 응급실 방문 또는 제한된 활동으로 발현되지 않은 타 질병이나 부상을 확인하지 않았고, 연관성은 인과 관계로 해석 될 수 없으며, 다른 환경의 노인이나 가벼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일반화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진행성 중증장애나 급성중증장애에 상관없이, 지역사회 노인들 사이의 중증장애는 중재 질병이나 부상에 의해 발병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고령화 사회에서 중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재 질병이나 부상을 예방하고 관리하고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




